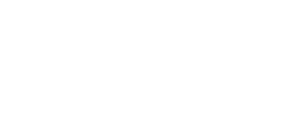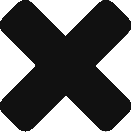“비행기는…”
비행기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가면 볼 수가 있는지 설명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 마치 공기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그것을 설명하는 것과 같았다. 너무 당연해서 그런지.. 통역하던 현지인 사역자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 아이들은 외계인의 비행접시 이야기만 듣다가 집으로 돌아갈뻔 했다. 그는 분명 자세하고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설명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때까지도 이해가 안간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몇년전 동남아시아 깊은 산속에 위치한 작은 오지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다. 전기가 없으니 TV나 전기제품은 존재할 리가 없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로 샤워를 하고, 거기에서 빨래도 하고, 음식도 만든다. 산에서 키우는 쌀이 주식이고 이따금 산 속에서 야생 동물을 잡으면 특식을 먹는 날이다. 이곳은 관광객은 커녕 외국인 한명 다녀가지 않는 마을이다. 나도 현지인 사역자가 아니었다면 세상에 이런 마을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았을 것이다. 사역자가 자기의 고향 마을이라며 이 마을로 데리고 왔기에 올 수가 있었던 것이다.
아이들에게 문명의 혜택을 주고 싶어서 플라스틱 악기를 한 박스 샀고, 몇가지 학용품도 가지고 갔다. 그러나 도착해보니 그 아이들은 악기는 커녕 색연필도 구경해 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었다. 공산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마을에 하나뿐인 학교에는 90명 가량의 아이들이 있었지만 선생님은 하나 뿐이었다. 한명의 선생님이 이 아이들을 모두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이들과 공작을 하면서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 날리는 놀이를 했다. 아이들은 작은 비행기를 하늘로 날리며 마치 자기가 하늘을 나는 것처럼 좋아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가 만든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것이 비행기라고 설명을 하느라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했던 1903년 당시로 돌아가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것과 같은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다.
학교가 끝나면 동네 한가운데 있는 마당에서 아이들과 놀이를 했다. 장난감이라고는 나무토막이나 대나무 정도가 전부였다. 내가 볼 때 아무 의미도 없을것 같은 놀이인데도 아니들은 그저 즐겁고 행복하기만 했다. 나무 토막 하나를 놓고 서로 갖겠다고 법석을 떨기도 했다.
저녁에 마당에서 놀고 있으면 학교에서 보이지 않던 아이들도 간간이 보였다. 낮에 왜 학교에 오지 않았냐고 물으면 부모를 도와주러 산에 가서 일을 했다고 대답했다. 어떤 아이는 온 식구가 일하러 먼 곳으로 갔기 때문에 집에서 아이를 보고 집안 일을 하느라 학교에 못간다고 했다. 짐작하건데 8살정도 밖에 안된 아이였다. 그런 아이들이 밭으로, 강으로, 집에서 일을 하느라 교육은 항상 우선순위 밖이었다.
낮에 학교에 오지 못했던 아이에게 주머니에 있던 캔디 하나를 꺼내주면 그는 너무 고마와 어쩔줄 몰라했다. 그러나 그것을 자기 입에 넣는 것이 아니라 등에 업고 있던 더 어린 아이의 입에 넣어 주었다. 학교에서 만들어 날리던 종이 비행기가 남아 있어서 그것을 주면 어떤 아이는 마치 보잉 747 진짜 비행기를 받은 것처럼 좋아했다. 풍선 하나 불어줘도, 크레용 반토막을 쥐어 줘도 아이들은 세상의 모든걸 얻은 것처럼 좋아하고 행복해 했다.
그 순간마다 나는 그 아이들의 눈빛속에 비치는 내 모습을 볼 때가 있다. 거울을 사이에 두고 그들의 삶과 내 삶이 거꾸로 비치는 모습이다. 이 아이들은 종이 한장만 있어도 만족하고 행복해 하는데, 나는 무엇을 더 가져야 행복할까? 이 아이들은 캔디 하나만 있어도 만족해 하는데 난 뭘 얼마나 더 잘 먹어야 만족스럽게 먹었다고 할 수가 있을까? 그때마다 깨달아진다. 내가 만족의 수준을 낮추면 지금 이순간도 만족하고 행복하지만, 비교하는 삶은 행복과 멀다는 것을…